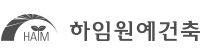서울에서 2023∼202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6-15 23:36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에서 2023∼2024년 연속으로 외래 흰개미가 출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4일 학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지난달 한국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작년 4월 2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 적재된 종이상자에서 외래 흰개미 약 100마리를 발견했다.흰개미가 먹이로 삼았던 종이상자는 소각됐다.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포장재였다. 발견된 흰개미 가운데 번식이 가능한 개체는 없었고, 주변으로 확산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유전자 검사 결과 이들 흰개미는 아시아집흰개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명은 '콥토테르메스 게스트로이(Coptotermes Gestroi)'다.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마른나무흰개미과 크립토털미스속'에 속하는 흰개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집흰개미는 4년에 6만마리씩 늘어날 정도로 군체 성장 속도가 빨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흰개미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역망이 뚫린 셈이다.2023년 5월에도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나온 적 있다. 흰개미는 나무를 분해해 탄소를 자연으로 환원하고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목조문화재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다.국내에 출현한 두 흰개미 모두 열대종이라 정착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대만흰개미로 불리는 '콥토테르메스 포르모사누스(Coptotermes Formosanus)'는 얘기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대만흰개미는 온대종이라 한국 생태계,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번식 속도도 빠르고 군체 규모는 수백만마리에 달한다. 이 때문에 친척뻘인 아시아집흰개미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형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사람과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일자리,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취임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는 사람의 꿈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일자리 프레임워크’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독일 KIEL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독일 유학 시절 마이스터 제도를 직접 목격하며 형성된 철학이 재단 운영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0.5 & 0.75잡 ▲라이트잡 ▲주 4.5일제 도입 등 유연근무 중심의 일자리 프레임워크 전환에 속도를 내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적 모델을 경기도에서 구현하고 있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삶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민하는 일자리 설계자 윤 대표를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의 미래를 들여다봤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Q. 지난해 12월 연임이 확정됐다. 지난 1년6개월간 재단을 이끌어온 소회는.A. 경기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그동안의 임기는 ‘도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년이 희망을 품고, 경력 보유 여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중장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순간이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Q. 독일 유학 경험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점을 얻었다고 들었다.A. 독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진로를 정한다. 공부에 뜻이 없어 기술학교에 간 학생들도 15세부터 35세까지 20년간 한 분야에서 배워 결국 마이스터가 된다. 이들은 과장 초임과 유사한 소득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도 전문가로 존중받는다. 능력 중심 사회지만, 그 ‘능력’의 기준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삶 속 기술과 경험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공부 잘하는 것만이 능력’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길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Q. 그래서 재단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고객지원 >
> 고객지원 >